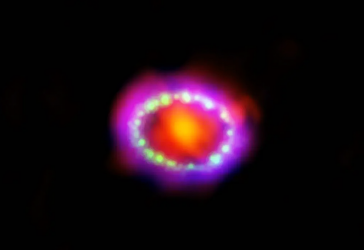사육되는 새들은 날개 모양이 변해 야생으로 돌려보내더라도 생존율이 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새끼를 낳기 위한 무분별한 사육은 물론, 멸종 위기에 몰린 동물 보호를 위한 인위적 사육 역시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에 학계 시선이 집중됐다.
호주 국립대학교(ANU) 야생 조류 연구팀은 21일 공식 발표한 논문에서 인간의 번식 프로그램에 따라 사육되는 새들은 토종과 달리 날개 형태가 변화하고 그 영향으로 하늘을 제대로 날지 못한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왕관앵무새 등 호주에 서식하는 야생 조류 16종의 날개 형태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 원래 야생에서 성장한 조류와 달리, 어떤 이유로든 인간에 사육된 새 4개 종에서 날개 변형이 확인됐다.

조사 관계자는 "주익을 비롯해 꼬리날개 등 추진력을 만들고 방향을 조정하는 날개의 변형이 뚜렷했다"며 "비행기 날개가 조금만 떨어져 나가거나 비틀리면 큰 사고가 벌어지는 것처럼 새의 날개 모양이 바뀌면 하늘을 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날개가 변형되면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른다. 이는 새는 물론 다람쥐나 도마뱀 등 날개가 달린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다. 붉은하늘다람쥐의 경우 날개 모양이 변하면 정상 개체에 비해 생존율이 약 37%까지 감소한 연구 결과가 있다.
조사 관계자는 "철새의 경우 날개 모양이 달라지면 삶 자체가 곧장 위협받게 된다"며 "집에서 기르는 조류를 포함, 사육이라는 범주 안에 드는 조류를 향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멸종 위기 조류 일부를 학자들이 인위적으로 사육하는 것 역시 날개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체가 급격히 줄어든 호주 고유종 주황배앵무새의 경우 학자들이 보호·사육하는 과정에서 날개 모양이 변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개체를 야생으로 돌려보낸 경우 생존율 역시 떨어진 것으로 판명됐다.
주황배앵무새는 태즈메이니아 섬과 호주 본토 남해안 사이를 오가는 습성이 있다. 몸길이 약 20㎝로 수컷과 암컷의 생김새가 다소 다르다. 번식기가 되면 약 240㎞나 떨어진 태즈메이니아 섬으로 건너가 번식하고, 짝짓기 시즌이 끝나면 다시 호주 남안으로 돌아온다.
조류학자들은 야생 주황배앵무새가 2018년 기준 20마리 이하로 감소하자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꾸미고 인공 사육에 나섰다. 몇 차례 번식활동 후 일부를 자연으로 보냈는데, 80%가 죽을 정도로 생존율이 떨어져 문제가 됐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