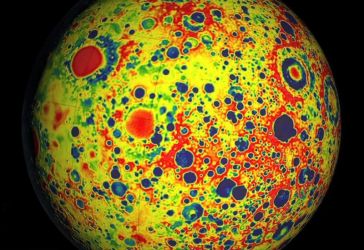침팬지가 인간의 말로 의사소통을 할 줄 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교(KTH) 음성학자이자 인지과학자 악셀 엑스트룀 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말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낸 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했다.
연구팀은 혈연관계가 없는 다른 대륙의 침팬지 두 마리의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다. 첫 번째 영상은 1944년 태어나 2007년 죽은 침팬지 조니의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 선 코스트 영장류 보호구역에서 지낸 조니는 말하는 침팬지로 유명했다.
유튜브 영상에서 조니는 "엄마라고 말할 수 있어?(Can you say mama?)"라는 여성 사육사의 질문에 똑똑히 "엄마(mama)"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엑스트룀 교수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육사에게 분명히 사람 말을 배운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어 "영단어 엄마(mama)의 'm'은 인간의 언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발음이고 아기가 처음 내는 소리 중 하나"라며 "특히 'm-모음-m' 패턴은 인간이 비교적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침팬지가 '아빠'나 '컵'을 똑똑히 발음하는 1960년대 녹음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팀은 조니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원래 침팬지는 들은 소리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모방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말을 배운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엑스트룀 교수는 "두 침팬지의 자료는 유인원이 발성 학습이 가능하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며 "침팬지의 신경계, 청각, 발성 시스템은 지금까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뛰어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교수는 "인간은 자발적으로 입이나 턱의 동작을 음성과 연동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영장류는 이런 능력이 없다"며 "다만 침팬지는 발음 능력이 인간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두 침팬지가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침팬지가 앵무새처럼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 하는 것은 이전 실험에서도 밝혀졌다. 학자들은 뇌 용량 차이로 인해 침팬지가 내는 소리는 인간과 달리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다고 여겨왔다. 연구팀은 이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을 가능성을 이번 조사를 통해 제기했다.
엑스트룀 교수는 "침팬지 조니는 사육사 모두를 엄마라고 불렀다. 이는 조니가 식사 때마다 엄마라고 말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는 증거"라며 "야생 침팬지는 주로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다양한 발성법까지 활용할 가능성을 이번 연구가 보여줬다"고 역설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