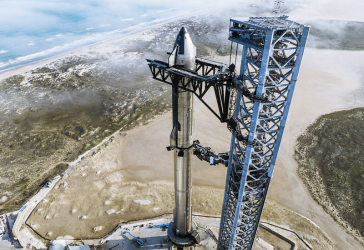시리아에서 발굴된 원통형 유물이 알파벳의 역사를 500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계는 알파벳의 역사가 새롭게 작성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고고학 연구팀은 미국해외연구학회(ASOR) 최신호에 게재된 조사 보고서에서 기원전 1800년 무렵으로 생각 돼온 알파벳의 기원이 실제는 더 오래됐을지 모른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그 근거로 시리아 북서부 고대도시 움 엘 마라(Umm el-Marra) 유적에서 나온 원통형 유물을 꼽았다. 기원전 2300년 제작된 이 유물에는 일련의 문자가 새겨졌는데, 완전한 해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를 이끈 글렌 슈왈츠 박사는 "최초의 알파벳은 기원전 1800년 경 셈어족이 이집트에서 상형문자의 일부를 도입해 탄생했다고 여겨졌다"며 "이들 초기의 문자 체계는 중동 전역에서 최종적으로 서유럽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대도시 움 엘 마라의 유적에서 나온 약 4400년 된 원통형 점토 유물에 새겨진 것이 문자가 맞는다면 알파벳의 역사는 기원전 23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며 "첫 알파벳의 역사가 500년은 더 오래됐을 가능성에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원통형 유물은 총 4개로 지난 2004년 출토됐다. 움 엘 마라 유적에 자리한 청동기시대 초기 무덤에 묻혀 있었는데 사람 손가락 정도 크기이며 표면에는 문자로 보이는 것이 새겨졌다.

연구팀은 근처에서 도자기 등 그릇들이 나온 점에서 아무래도 내용물이나 소유자를 식별하는 표식일 것으로 봤다. 속이 비었는데, 이는 끈을 넣어 쉽게 다루기 위한 설계로 추측됐다.
너무 복잡해 일부 고위급만 사용한 원시 쐐기문자(proto-cuneiform)나 상형문자와 달리 알파벳은 널리 퍼져 정보를 기록하거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줬다. 이러한 서기 체계의 민주화는 상업, 통치, 일상생활에서 문어가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글렌 교수는 "움 엘 마라는 청동기시대 초기 중규모 도시로 보석과 무기 등 부장품이 풍부한 고위급 인사의 무덤이 여럿 자리한다"며 "가치나 위상, 중요도를 가늠하면 원통형 유물을 통해 알파벳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고대도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통형 유물 속 문자가 알파벳의 기원이라는 설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연구팀 역시 유물 속 비문이 당시 주로 사용되던 원시 쐐기문자와는 다르고 오히려 초기 셈어와 비슷하다고 인정했다.
글렌 교수는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에 따라 원통형 유물의 연대는 특정됐지만,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물건의 명칭이나 설명이 아닐까 추측되지만 더 많은 예를 연구해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만약 우리 가설을 입증할 증거가 나온다면 최초의 알파벳이 이집트가 아니라 시리아 혹은 근동의 어딘가에서 출현한 것이 된다"며 "고대 언어의 출발에 대한 통찰은 물론 고대 사회가 어떻게 사상을 공유하고 자원을 관리하며 정체성을 형성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