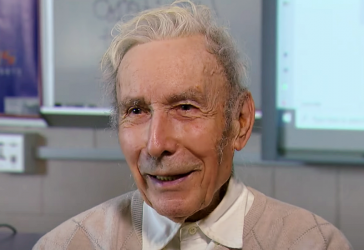9개월째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가운데, 이를 어기는 행동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원래 익숙하지 않은 것을 갑자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이나, 감염증이 심각한 마당에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하철 난투극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감염 자체보다 후유증이 더 무섭다는 코로나19. 그런데도 왜 일부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부하며 마스크도 팽개치는 걸까. 이를 과학적으로 접근한 미국의 대학 연구팀은 뇌 용량과 관계가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내놨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리버사이드분교 심리학 박사 스티븐 캠밸과 장 웨이웨이 연구팀은 최근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뇌의 작업기억(working memory) 용량이 떨어진다고 보고했다.
'뇌의 메모장' 또는 '마음의 칠판'으로 표현하는 작업기억은 어떤 정보를 짧은 시간 보유하고 각종 인지적 과정을 계획해 실제로 수행하는 단기 기억이다. 즉 사람이 경험한 것을 수 초 동안만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 기능을 의미한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작업기억으로서 저장 가능한 정보량, 즉 작업기억의 용량을 그 사람의 지력, 이해력, 학습력 등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연구팀은 작업기억 용량이 큰 사람일수록 마스크 착용이나 손소독제 사용, 기침 매너 지키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잘 지킨다고 결론 내렸다. 반대로, 작업기억이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적으로 습관화하는 데 애를 먹는 경향이 관찰됐다.

스티븐 캠밸과 장 웨이웨이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아닌 뇌 기억용량에 문제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했다. 이해력, 지능, 학력, 생활수준, 성격이 제각각인 미국인 85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지, 그럴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질문했다.
사람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 준수 여부는 개인의 성격 외에도 작업기억의 용량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기억 용량이 작은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 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습관화하려면 작업기억을 동원해서 그것이 이익인지, 불이익인지 저울질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 의사결정 진행에 있어 작업기억 용량이 작을 경우 저울질 자체에 과부하가 걸려버린다.
연구팀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정부나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작업기억 용량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변화를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 웨이웨이 박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방역, 마스크 착용 등은 가능한 작업기억이 쉽도록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며 "이를 정부나 방역당국, 미디어가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이안 기자 anglee@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