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개봉한 SF영화 '스타트렉2: 칸의 분노'에는 '프로젝트 제네시스(Projetect Genesis)'라는 것이 등장한다. 행성 표면에 '제네시스 디바이스'라는 장치를 떨어뜨려 폭파시키면 모든 것들을 녹인 뒤 몇 시간 뒤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재창조하는 행성 개척 프로젝트다. 워낙 무시무시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적들의 타깃이 되기도 하고 부작용으로 행성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기도 해 결국 봉인된다.
우주생물학 저널 4월호에 게재될 논문에 영화 속 '프로젝트 제네시스'와 비슷한 아이디어가 등장해 화제다. 게다가 연구자 스스로 "스타트렉의 제네시스 실험과 같을 것"이라고 언급, 관심이 쏠린다.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우주생물학자 찰스 코켈 교수가 주장하는 핵심은 '죽은' 외계행성을 연구하자는 것이다. 현재 외계 생명체 연구는 대부분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조건을 갖춘 곳에 집중됐는데, 나머지 대다수 행성을 배제하는 것은 막대하고도 잠재적으로 유익할 수 있는 점을 놓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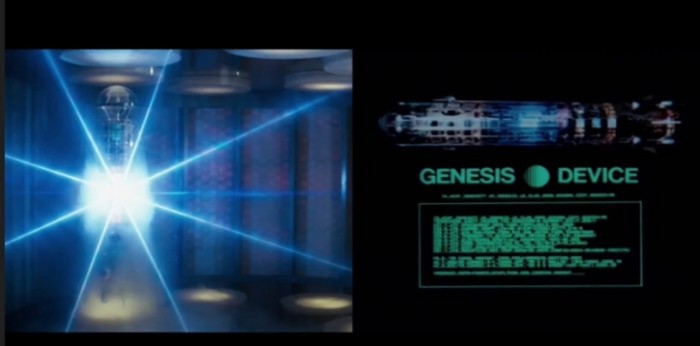
코켈 교수는 "생명으로 가득하다고 여겨지는 우리 지구조차도 표면의 얇은 생물권을 제외하면 내부의 대부분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생명체가 없다고 여겨지는 행성을 연구하는 것은 실제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밝혀낼 수 있을 뿐더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의 한계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교수는 강조했다.
교수는 생명체가 없는 행성은 '깨끗한 실험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장소에 소량의 미생물을 방출, 생존 여부와 확산 속도, 행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달이나 화성 이주를 앞둔 인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미래의 타 행성 거주자들은 어떤 박테리아를 투입해 행성 토양을 작물 생산에 적합하게 만들지 미리 알아낼 수 있다.
생명체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행성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다. 당장 태양계만 해도 어느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목성의 유로파나 토성의 엔셀라두스같이 얼음으로 덮힌 곳에 생명체가 없다고 판명되면, 박테리아를 투입하고 1만년 정도 모니터링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코켈 교수는 전망했다. 제네시스 실험과 비슷하다고 밝혔던 게 이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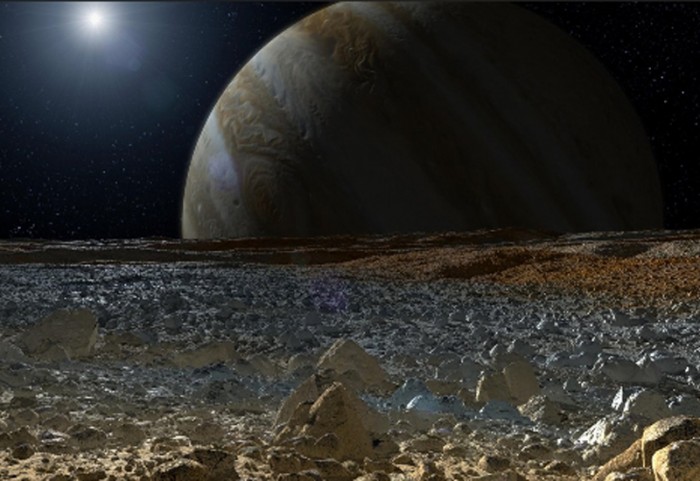
물론 여기에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여럿 있다. 당장 1967년 국제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부터 걸린다. 이에 따르면 우주활동으로 인한 외계의 오염 행위는 금지된다.
게다가 지난 2019년 이스라엘 민간 우주업체가 이미 사고를 쳤다. 이스라엘 최초의 달 무인 탐사선 '베레시트'는 임무 도중 고장으로 달에 추락했는데, 곰벌레 수천 마리를 탑재한 사실이 나중에 들통났다. 크기가 1㎜ 이하인 곰벌레는 151℃의 고온과 -273℃의 저온을 견디는 것은 물론 고압과 저압, 방사선도 이겨내는 엄청난 생존력을 자랑한다.
코켈 교수는 이런 문제에도 생명체가 없는 행성 탐사는 우연히 생명체를 발견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지구에서도 심해 잠수함 탐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해저의 열수구 근처에 유기물이 존재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만약 외계에서 그런 장소를 찾아낸다면 생명체 생존 조건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를 바꿀 수도 있다고 교수는 내다봤다.
코켈 교수는 "이 연구의 요점은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환경을 찾는 데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며 "생명이 없는 세상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채유진 기자 eugene@sputnik.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