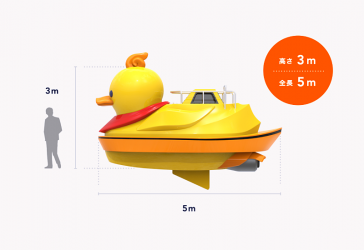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부모로부터 전달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확하게는 부모가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험이 자식에게까지 전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마운트시나이의과대학교 에피제네틱스 연구팀은 최근 실험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야기되는 부모의 유전정보 변화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에피제네틱스(epigenetics)란 유전자 염기서열이 변하지 않더라도 염색질 구조 변화를 일으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말로는 후생(성)유전학이라고 한다.
연구팀은 쥐의 정자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이번 실험에 응용했다. 먼저 수컷 쥐들을 무작위로 선별한 뒤 각각 정자 RNA를 해석하고 기록했다. 이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쥐들을 열흘간 노출시켰다. 비교적 얌전한 쥐와 공격적인 쥐를 한데 사육하는 방법을 썼다.

쥐들은 자극 수준에 대한 반응에 따라 스트레스에 약한 그룹과 강한 그룹으로 구분됐다. 이후 쥐들의 정자 RNA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에 약한 그룹의 쥐는 열흘 전에 비해 1460개 유전자가 변화했다. 스트레스에 강한 그룹은 단 62개만 변화를 보였다.
연구팀은 스트레스에 약한 수컷 쥐들을 암컷과 교배시켜 새끼를 얻은 뒤 면밀히 관찰했다. 그랬더니 새끼들도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관계자는 “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어난 유전정보 변화가 새끼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스트레스에 약한 수컷 쥐와 교미한 암컷 쥐들이 유전자 정보를 아는 듯 임신과 출산과정에 보다 신경을 썼다는 사실이다. 같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실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실험 관계자는 “이는 정자 자체에 스트레스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연구팀은 이런 유전적 메커니즘을 쥐뿐 아니라 다른 생물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사람도 스트레스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는 자극이 부모에서 자식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연구팀 입장이다.
실험 관계자는 “이번에 관찰된 내용들은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된 사람들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며 “본인이 스트레스에 약하다고 판단된다면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분장애 같은 스트레스성 질환은 사람마다 증상이 제각각이고 치료법도 달라 고치기가 어렵다”며 “스트레스성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더 규명되면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법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이안 기자 anglee@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