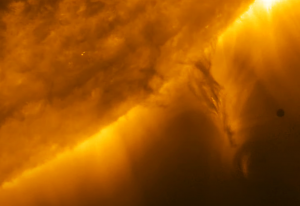사람이 기분이 나쁠 때마다 속이 쓰린 이유는 감정이 위산 분비량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차대학교 연구팀은 13일 발표한 논문에서 사람의 몸은 부정적 감정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를 막기 위해 위산 분비를 조절한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공포나 혐오감이 들 때 일반적으로 속이 불편해지는 것은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이런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팀은 사람들을 동원해 간단한 실험에 나섰다.
심신이 건강한 남녀 31명을 모은 연구팀은 센서가 장착된 초소형 스마트 알약을 삼키게 하고 산성도나 온도, 압력 등 위장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알약을 먹은 참가자들은 9초 분량의 동영상을 4개 시청했다. 각 영상은 즐거움과 혐오(공포), 슬픔, 중립적 감정을 일으키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팀은 영상 시청 후 소감을 자유롭게 적어 달라고 주문했다.
그 결과 공포 및 혐오감이나 슬픔을 유발하는 영상을 본 피실험자들은 위산 분비량이 뚜렷하게 늘었다. 동시에 호흡이 가빠지는 사람도 있었다.
조사 관계자는 "혐오나 슬픔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의 위산이 대량으로 분비되는 것은 위장의 pH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즉 위장 내 환경이 빠르게 산성으로 변하면서 위산 분비가 촉진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위장 근육 벽의 전기 활동에도 변화가 생겼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이 사람의 감정은 신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사 관계자는 "우리 몸의 이런 반응은 마음에서 몸, 그리고 몸에서 마음으로 양방향 작용한다"며 "예컨대 피실험자가 구역질을 막아주는 약을 먹고 불쾌한 장면을 볼 경우 위산 분비가 다소 줄고 심리적 괴로움도 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감정에 따른 위산 분비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공포 반응의 일종이라고 결론 내렸다. 우리 몸은 불쾌하고 위험한 기분을 느낄 때 몸이 알아서 신호를 보내도록 진화했다는 이야기다.
신체 기관들이 감정과 연결돼 유기적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은 전에도 밝혀졌다. 뇌와 심장이 대표적이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가 소규모로 진행된 만큼, 향후에는 보다 많은 사람을 모집해 대규모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