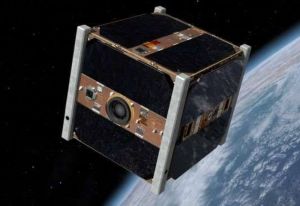화성의 자기장은 학자들의 예상보다 약 2억 년 더 계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성에 물이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오래 지속됐을 가능성에 학계의 관심이 쏠렸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천문학 연구팀은 화성 자기장이 최소 39억 년 전까지 유지됐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팀은 이 시기가 화성에 물이 존재한 때와 겹치는 만큼 생명체 탐사의 양상이 바뀔지 모를 중요한 발견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화성 자기장이 영향력을 발휘한 기간이 너무 짧게 추정됐다고 전제했다. 행성의 자기장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이너모 효과에 의한 것인데, 학자들이 화성 다이너모 효과를 간과했다는 게 연구팀 생각이다.
하버드대 사라 스틸 연구원은 "지구의 경우 철과 니켈 핵은 고체의 내핵과 액체의 외핵 두 부분으로 구성되지만 탄생 직후의 핵은 완전한 액체였다"며 "시간이 지나 식고 굳어 고체 내핵이 성장했고 내핵에서 열이 도망갈 때 액체 외핵을 상승시켜 대류를 일으켰다. 외핵이 원래 있던 자기장을 통과하면 전류가 발생하고 자기장이 강해지는 것이 행성 내부의 다이너모 효과"라고 설명했다.

화성 자기장은 길면 41억 년 전, 짧으면 37억 년 전 완전히 사라졌다고 여겨져 왔다. 화성은 내부의 냉각이 빨라 대류가 금방 멈췄고, 그 결과 자기장도 금세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자기장의 소실로 태양풍을 막지 못해 대기와 물이 소실됐고 생명에 해로운 우주선이 가차 없이 쏟아졌다는 게 학자들의 추측이다.
사라 스틸 연구원은 "이런 가설의 근거는 41억~37억 년 전 화성에 생긴 거대한 충돌 분지에 남은 자기의 흔적"이라며 "천체가 충돌하면 대단한 에너지가 발생하고 암석은 녹아 버린다. 만약 화성에 자기장이 있다면 암석이 식어 굳을 때 자력을 띤 광물은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화성 탐사 결과 충돌 분지에는 그러한 흔적이 없어 학계는 41억~37억 년 전 이미 자기장이 없어졌다고 추측한 것"이라며 "우리가 그 시기를 최소 2억 년 늘린 결정적이 증거는 지구에서 나온 운석"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이 언급한 운석은 1984년 남극 앨런 구릉에서 발굴된 ALH 84001이다. 이 운석을 조사한 연구팀은 화성에서 지자기 역전이 일어난 흔적을 확인했다. 지자기 역전은 북극과 남극의 자극이 뒤바뀌는 현상으로 지구에서도 수십만 년마다 일어난다.

사라 스틸 연구원은 "만약 화성 충돌분지가 형성된 시기에 지자기 역전이 있었다면 녹은 암석에 포함된 자성광물은 제대로 지자기에 정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우리 생각이 맞는다면 당시 화성에는 지자기가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흔적은 남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새로운 시뮬레이션에서 화성의 자기장은 41억 년 전에 사라지지는 않았으며 적어도 39억 년 전까지 존재했을 가능성이 떠올랐다"며 "자기장이 유지되는 기간이 2억 년 늘어나면 화성의 대기가 보다 안정되고 생명체의 분포도 그간의 생각과 확연히 달랐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연구팀은 자신들의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화성의 대기가 언제까지 제대로 기능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화성의 물 및 대기의 비밀을 캐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NASA)이 운용하는 메이븐 탐사선의 자료를 향후 분석할 계획이다.
정이안 기자 anglee@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