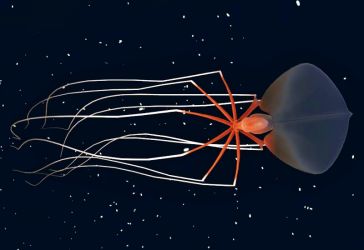인공지능(AI) 챗봇에 불만을 털어놓으면 감정이 누그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슴에 쌓인 울분을 타인에 토로하면 심적 안정을 얻는 메커니즘이 인간 대 기계에서도 확인됐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SMU) 심리학 연구팀은 9일 이런 내용의 실험 보고서를 내고 AI 챗봇을 활용한 저널링(journaling)의 유의미한 효과를 소개했다. 저널링이란 대화 또는 문자로 감정을 토해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이다.
실험 관계자는 "뭔가 싫은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저널링이 효과적"이라며 "홀로 지내는 사람이 많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저널링의 대상은 인간이 아닌 AI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챗(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는 음성 대화 기능을 탑재해 거의 위화감 없이 인간과 수다를 떨 만큼 발달했다"며 "기계에 대고 과오를 털어놓는 AI 고해성사가 최근 유럽에 등장한 것만 봐도 인공지능의 저널링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남녀 대학생 150명을 무작위로 모아 AI를 이용한 하이테크 저널링이나 글을 쓰는 저널링을 시도해 얼마나 기분이 가벼워지는지 알아봤다. 최근 경험한 짜증이나 불만에 대해 10분간 글을 쓰거나 AI와 대화하도록 한 뒤 감정 변화를 살펴봤다.
그 결과 AI에게 불평을 늘어놓은 피실험자는 글로 감정을 입력한 이들보다 분노나 짜증 같은 불쾌한 기분이 덜했다. 실험 관계자는 "AI가 실력파 카운슬러처럼 피실험자 개개인에 맞춰 제대로 대응한 것이 참가자의 기분전환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추측했다.

연구팀은 다만 인공지능이 아직 슬픔을 치유하지는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실험에서 나타났듯 분노나 짜증처럼 머리에 피가 차오르는 감정은 AI와 수다를 통해 진정됐지만 슬픔 같은 가라앉은 감정에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실험 관계자는 "감정을 쏟아낼 때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분노 등 폭발적인 감정으로, 슬픔 같은 무거운 기분과는 무관한 것 같다"며 "아무리 대거리를 잘해주는 고성능 AI도 인간의 고독감 등 기저에 깔린 슬픔을 덜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이안 기자 anglee@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