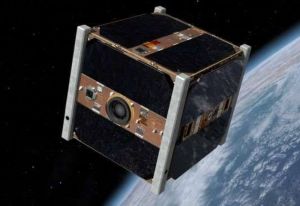어느 날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 당신을 향해 고양이가 눈을 치켜뜨고 "야옹"한다면, 그 뜻은 빤하다. "빨리 밥 내놓아라, 집사야!"란 의미다.
하지만 이런 '야옹'은 인간 말고는 거의 들을 수 없다. 인간을 위해 특화된 대화 방법이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약 1만년 전부터 인간과 살아왔다. 지난 2017년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200마리 이상의 고양이 DNA 조사를 실시, 기원전 8000년경 고대 아나톨리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인간과 함께 고양이가 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즉 농경시대가 시작되며 쌓인 곡식을 쥐가 먹자 이를 퇴치하기 위해 천적인 고양이를 데려오면서 자연스럽게 고양이의 가축화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인간과 같이 살기 전에 고양이는 거의 단독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존 브래드쇼와 샛럴 버몬트의 책 '집 고양의 행동학(The Domestic Cat: The Biology of Its Behaviour)'에 따르면 고양이의 조상들은 다른 종족과 거의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고양이끼리도 얼굴을 맞대는 대신 나무에 몸을 문지르거나 소변을 마킹하는 등 후각을 통해 소통했다.
새끼일 때는 어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울기도 하지만 성체가 되며 '야옹'은 자연히 사라진다. 머서대학교에서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존 라이트 박사는 "아직도 고양이는 이런 방식으로 다른 고양이와 소통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고양이는 인간을 상대로만 '야옹'하는 걸까. 라이트 박사는 "인간은 고양이처럼 후각을 섬세하게 발전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고양이는 인간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행동 프로세스(Behavioral Processes)'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야생고양이는 집고양이 보다 으르렁거리거나 쉿 소리를 내면서 소통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또 야생고양이가 '야옹'하는 것은 인간 말고도 개나 인형 등 모두에게 무차별적이었다. 결국 '야옹'은 가축화되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학습한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이야기다.
고양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다면 적극적으로 의사 소통에 나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라이트 박사는 조언했다. 고양이가 야옹할 때 인간이 적절하게 반응하는 게 키 포인트라는 이야기다. 박사는 "야옹에 대해 당신이 충분히 구분하기 쉽고 호의적인 목소리의 답한다면 고양이는 당신과 적극적으로 의사 소통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채유진 기자 eugene@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