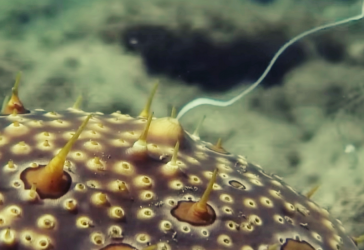'실연의 아픔'을 표현한 노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런 아픔이 단순한 은유 이상이며 실제 통증을 느낄 때와 비슷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심리학자 제프 맥도널드 교수 등 연구진은 지난 2011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를 통해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장치를 사용해 원치 않은 이별을 겪고 상심한 40명의 참가자의 뇌를 스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을 차버린 파트너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별을 떠올리거나 ▲친한 친구의 사진을 보며 행복한 추억을 상상한 것은 물론 ▲뜨겁지만 타지 않는 물체를 팔에 올려놓거나 ▲기분 좋게 따뜻한 물체를 팔에 올려놓는 등 4가지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경험토록 했다.
그 결과 전 파트너의 사진을 볼 때와 뜨거운 물체를 팔에 올려놓았을 때 고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성화가 최대 88%까지 동일했다. 친구 사진을 보거나 따뜻한 물체를 올려놓았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다른 524건의 다른 심리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로, 많은 심리학자는 우리의 초기 조상 때부터 정서적 고통이 뇌에 이미 존재하는 육체적 고통 시스템에 겹쳐져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고통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라며 "인간의 조상 때부터 생존을 위해 남들과 긴밀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협력하면 음식을 더 잘 모을 수 있고 포식자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다.
물론 육체적 고통과 정서적 고통이 똑같지는 않다. 이 연구에서도 fMRI에 나타난 결과는 뇌 활성화 부분이 겹치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왜 정서적 고통을 겪으면 발이나 무릎이 아니라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걸까. 이에 대해 일부 심리학자들은 뇌에서 목, 가슴까지 이어지는 '미주 신경(vagus nerve)'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증거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상심 증후군(broken-heart syndrome)'이라는 증상도 있다. 타코츠보 증후군(takotsubo syndrome)이라고도 불리는 이 증상은 사람의 죽음 등으로 스트레스가 갑자기 늘어나며 심근육이 경직됐다가 이완되는 등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미국심장학회(AHA)는 2019년 미국의 한 노부부가 71년간 해로한 뒤 같은 날 12시간 차이로 생을 마감한 사례를 상심 증후군으로 구분했다.
채유진 기자 eugene@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