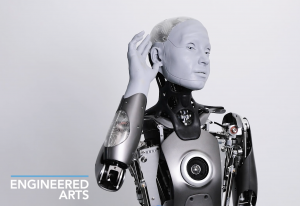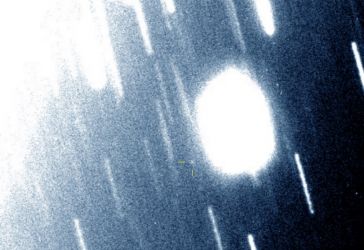항암치료의 영향으로 구토하는 네 살 소년과 안쓰러운 표정으로 등을 어루만지던 누나의 뒷이야기가 2년 만에 전해졌다. 백혈병으로 힘들어하던 소년은 가족과 지인,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 덕에 몰라보게 건강을 되찾았다.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주부 케이틀린 버지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흑백사진 한 장으로 사람들을 울린 딸 오브리(7)와 아들 버킷(6)의 근황을 전했다.
케이틀린에 따르면 2018년 4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화학요법과 수혈을 반복해온 버킷은 독한 항암치료를 꿋꿋하게 버틴 덕에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했다. 아직 항암제를 복용하며 집에서 요양 중이지만 다 죽어가던 2년 전에 비해 살도 붙고 외출도 할 정도로 건강해졌다.

버킷의 사연은 지난 2019년 케이틀린이 페이스북에 올린 흑백사진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사진은 오브리가 변기에 대고 토하는 동생 버킷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상황을 담았다. 머리가 죄다 빠진 어린 동생이 안쓰럽고 대견했는지 오브리는 더러워진 변기를 직접 치우고 동생 손도 씻겼다.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각계에서 온정이 쏟아졌다. 비싼 항암치료 탓에 딸 오브리가 좋아하는 체조교실도 끊었던 케이틀린은 사람들의 지원과 관심에 힘을 냈다. 남매를 취재하고 싶다는 신문사와 방송국 연락도 쇄도했다. 남매의 이야기는 미국을 넘어 세계 각국에 전해졌다.

케이틀린은 “오브리의 다섯 번째 생일에 버킷이 한 달 이상 입원을 마치고 집에 온 적이 있다”며 “건강하고 통통하던 동생이 홀쭉해진 걸 보고 오브리가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혼자 걸을 수조차 없는 동생이 안쓰러웠는지 그때부터 쫓아다니며 정성으로 보살폈다”고 돌아봤다.
이어 “버킷의 치료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 낙담했는데 오브리는 다 괜찮다며 먼저 이해해 줬다”며 “동생의 병과 고통을 어린 나이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대견해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쏟은 기억이 생생하다”고 덧붙였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