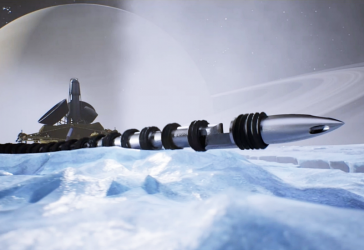고양이가 사람 손에 길들여진 기원과 그 시기가 유전자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미국 미주리대학교 연구팀은 31일 공식 채널을 통해 고양이가 가축화된 시기는 약 1만 년 전이며, 계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생활상과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분포한 고양이 1000마리 이상의 유전자 마커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총 200개에 달하는 유전자 마커 조사에서 고양이는 티그리스 및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펼쳐진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처음 사람 손에 길들여졌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 인류는 각 대륙에 정착하면서 수렵 및 채취 생활을 버리고 농경사회를 이뤘다. 이 때문에 고대인들의 생활상이 크게 변화하면서 집고양이가 최초로 등장했다고 연구팀은 파악했다.

조사 관계자는 "지질시대 마지막 단계인 완신세에 들어서자 인류는 수렵 및 채집 생활을 마감하고 농사를 짓게 됐다"며 "농작물을 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양이의 가축화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당시 인류가 처음부터 고양이를 가축화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농작물을 노리고 쥐 같은 불청객이 촌락으로 몰려들자 야생 고양이가 따라왔고, 쥐의 천적이 고양이라는 것을 깨달은 고대인들이 고양이를 포획, 가축화했다는 이야기다.
인간과 고양이의 공동생활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시작됐다는 가설은 이전에도 나왔다.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별 고양이의 DNA 등 유전자적 마커를 추적 조사하면서 결정적 증거가 잡혔다.

조사 관계자는 "티그리스 및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고양이가 인간과 함께 세계로 퍼져나간 것은 고양이의 유전적 특성이 입증해 준다"며 "고양이는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유전적으로 서로 닮지 않는 경향이 결정적 힌트였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서유럽에 사는 고양이의 유전자는 동남아시아 고양이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고양이들의 유전자적 마커의 기원이 되는 지역을 압축한 결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특정됐다.
아울러 연구팀은 고양이가 개나 말처럼 쉽게 인간의 말을 듣지 않았고, 고양이의 가축화는 엄밀하게 '반가축화'라고 정의했다. 이 근거에 대해 조사 관계자는 "만약 고양이를 야생에 풀어주면 여전히 쥐 등을 사냥하고 평범하게 살아 번식할 수 있었다"며 "먹이가 모자라 사람들에게 의지한 개와 달리 가축이 되는 과정에서 야생 고양이의 행동이나 습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유전자를 활용한 고양이 연구가 개체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유전자 연구 결과를 고양이들을 치명적인 유전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연구팀은 페르시아고양이의 38%가 다발성 낭포신을 가진 것을 지난 2004년 유전자 조사로 알아냈다. 여기에 대응한 연구팀의 노력으로 지금은 이 비중이 많이 작아졌다.
이번 연구는 11월 국제 학술지 'Heredity'에 소개될 예정이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