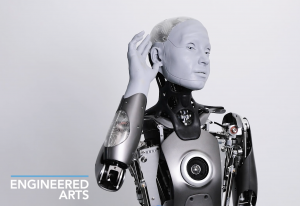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은 데니소바인이 물려준 특수 유전자의 보호를 받는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유골 등 샘플 부족으로 연구가 더딘 데니소바인은 일부 현대 인종에 유전자를 남겼다는 가설이 이어져 왔다.
프랑스 국립 과학센터(CNRS) 연구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태평양 뉴기니섬 동부에 자리한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데니소바인으로부터 받은 변이 유전자를 특정했다.
파푸아뉴기니는 섬 하나에 다양한 환경이 조성된 독특한 국가다. 일단 산악지대가 많아 고지대는 산소가 적은 가혹한 환경이 펼쳐진다. 저지대는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자주 창궐해 인구의 40%가 사망한 적도 있다.

CNRS 관계자는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은 고지대와 저지대에 나눠 거주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수천 년 동안 서로 분리됐다"며 "이런 특이점 때문에 학자들은 이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변이했는지 주목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크게 다른 환경에 각각 적응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은 저마다 돌연변이를 일으켜 진화했다"며 "수만 년 동안 아시아에 살던 데니소바인들과 접촉한 결과, 현재 파푸아뉴기니 사람의 게놈 중 최대 5%가 데니소아인의 것으로 구성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파푸아뉴기니의 저지대 사람들이 말라리아 등 감염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전자를 데니소바인에게 받은 것으로 추측했다. 고지대 사람들은 저산소증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전자를 데니소바인에게 얻은 것으로 의심했다.

연구팀은 최고 높이 4509m의 윌헬름 산 고지대에 사는 주민 54명과 해발 100m 미만 저지대 거주민 74명의 게놈을 분석했다. 그 결과 데니소바인이 전한 것으로 보이는 저지대인의 돌연변이가 혈중 면역세포 수를 늘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대 주민의 경우 적혈구 수를 증가시켜 저산소증에 버티게 하는 돌연변이가 파악됐다.
CNRS 관계자는 "데니소바인의 유전자 변이체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기생충 등 저지대 병원체와 싸우도록 돕는 GBP2 단백질의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유전자는 저지대 사람들이 감염병과 싸우도록 돕기 위해 진화 과정에서 선택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관계자는 "멸종한 데니소바인의 유전자와 관련된 이번 발견은 약 5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서 넘어와 섬나라에 정착한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의 유전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