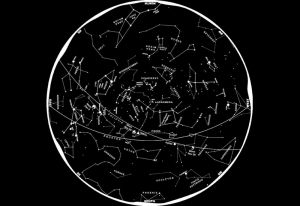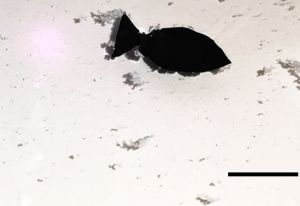야생동물도 사람처럼 알코올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며, 생존을 위해 이를 빠르게 분해하는 대사 방법을 개발해 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자들은 동물이 발효된 과일 등을 통해 알코올을 접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여겨왔다.
영국 엑시터대학교 행동생태학자 애나 볼랜드 교수 연구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동물 생태 조사 보고서를 지난달 말 국제 학술지 'Trends in Ecology and Evolution'에 냈다.
연구팀은 숙성된 과일이나 식물 수액, 꿀 등 다양한 형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알코올을 야생동물이 어떻게 섭취하는지 살펴봤다. 인간은 취할 목적으로 알코올을 즐기지만 동물은 영양분 섭취나 약효를 기대하고 이용할 가능성은 이전 실험에서 이미 검증됐다.

애나 볼랜드 교수는 "효모가 과일 등을 혐기분해하면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로 변환된다"며 "이는 효모가 스스로 견딜 수준의 에탄올을 만들어내면서 세균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기 위해 진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탄올의 역사는 속씨식물(현화식물)이 달콤한 열매를 만들기 시작한 약 1억 년 전 백악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효모의 발효 작용으로 에탄올이 만들어졌고 인류 농경의 출현과 함께 이는 더 보편화했다"고 덧붙였다.
효모는 환경 속에 폭넓게 분포하며 과일과 수액, 꽃의 꿀 등 당분이 많은 음식은 자연 발효된다.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동물들은 모두 에탄올을 접할 가능성이 크다. 자연적으로 발효하는 음식의 에탄올 농도는 알코올 도수로 기껏 1~2% 수준이지만, 파나마의 야자열매처럼 10.2%의 고농도도 존재한다.

애나 볼랜드 교수는 "동물이 인간처럼 고주망태가 되는 경우는 일부 종을 제외하면 상당히 드물다. 이는 만취한 상태에서 나무를 타거나 포식자를 만나면 생존율이 확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발효한 과일이나 꽃의 꿀을 먹는 동물은 알코올탈수소효소(ADH)의 능력을 키운 것 같다. 특히 영장류나 투파이(원시 영장류)는 술에 취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에탄올을 대사할 수 있게 됐다"고 추측했다.
야생동물이 진화를 거듭하면서까지 알코올을 이용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초파리는 기생충으로부터 알을 지키기 위해 에탄올이 풍부한 환경에 산란한다. 말라리아 다발 지역에 서식하는 침팬지는 야자주 속의 알코올이 말라리아 원충을 막아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애나 볼랜드 교수는 "동물들이 에탄올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예에서 보듯 에탄올은 엔도르핀과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해 평온함을 느끼게 하고 사교의 윤활유가 된다. 이를 동물도 인식할 가능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