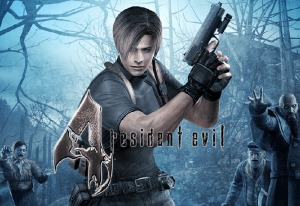20대에 아카데미상을 거머쥔 할리우드 톱스타 안젤리나 졸리(49)가 한때 장의사를 진지하게 지망했다고 털어놨다. 배우로서는 물론 연출자, 사회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졸리의 놀라운 과거에 팬들의 관심이 쏠렸다.
안젤리나 졸리는 최근 방송한 미국 NBC 간판 토크 프로그램 '투나잇 쇼(The Tonight Show)'에서 장의사를 꿈꾼 시절을 언급했다. 안젤리나 졸리가 장의사를 하려 했다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안젤리나 졸리는 "장례업은 제가 몸담은 연예계와 동떨어져 있지만 한때 장의사가 되려 열 일 제쳐두고 고민했다"며 "결정적인 계기는 할아버지의 죽음"이라고 돌아봤다.
그는 "할아버지의 죽음은 충격이었지만 어린 저는 삶의 끝이 두렵지는 않았다. 죽음에 대한 저항도 없었다"며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개념이 어렴풋이 있었다.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축하해야 할 인생의 이벤트 같았다"고 덧붙였다.

사람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장의사에 매력을 느낀 안젤리나 졸리는 관련 서적을 읽고 정보를 모았다. 그는 "아무래도 아버지(존 보이트), 어머니(마르셀린 버트란드)가 유명한 배우다 보니 같은 길을 택했지만 한동안 장의사에 관해 생각했다"며 "당시 경험은 제가 인생을 살며 사람들과 연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웃었다.
안젤리나 졸리는 1999년 영화 '처음 만나는 자유'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타며 연기파로 발돋움했다. 올해 8월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전설의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의 일생을 다룬 주연작 '마리아'로 기립박수를 받았다. 9월에는 캐나다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연출작 '위드아웃 블러드(Without Blood)'를 선보이며 재능을 과시했다.
서지우 기자 zeewoo@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