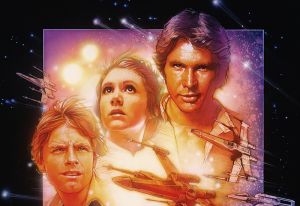약 6900만 년 전 남극에 살았던 오래된 물새 베가비스 이아이(Vegavis iaai)가 현생종 물새들의 시조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퍼시픽대학교 크리스토퍼 토레스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낸 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베가비스 이아이는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백악기 말 남극 베가 섬에 서식한 물새로 화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연구팀은 2011년 남극에서 발굴된 베가비스 이아이의 거의 온전한 두개골 화석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베가비스 이아이가 현대 물새와 공통된 특징을 여럿 가지며, 남극이 조류 진화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크리스토퍼 교수는 "어쩌면 현대의 모든 새는 남극에서 왔는지도 모른다"며 "베가비스 이아이가 새의 한 종으로 등재된 것은 2005년인데, 20년 만에 이 새가 현대 조류의 시조라는 단서가 잡혔다"고 설명했다.
현대 조류의 조상은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 이전에는 극히 드문 존재였다. 때문에 베가비스 이아이가 오늘날의 새와 연결되는 한 계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크리스토퍼 교수는 "20년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 단서는 2011년 남극 탐험대가 찾아낸 베가비스 이아이의 온전한 두개골 화석"이라며 "두개골의 CT 스캔을 실시, 3D 디지털 모델을 작성했더니 뇌두개와 구개, 부리, 하악, 뇌 모양 등 확실히 현대의 물새와 같은 특징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베가비스 이아이는 길고 뾰족한 부리와 물고기를 잡기 위한 강력한 턱 근육을 가졌다. 이런 요소들은 잠수성 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며 "부리의 코 부분의 발달된 염류선은 바다에서 잡은 먹이의 과도한 염분을 걸러 배출하는 기관으로 현재 펭귄이나 갈매기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 베가비스 이아이의 발은 물속 사냥감을 쫓을 추진력을 발휘하기 쉬운 구조다. 때문에 연구팀은 이 새가 바다 인근에 서식한 물새가 틀림없다고 결론 내렸다. 거대 운석에 의한 대량 멸종을 견딘 것은 당시 남극이 따뜻하고 식물도 풍부했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봤다.
크리스토퍼 교수는 "마다가스카르나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대멸종 전의 새들은 현생종들과 상당히 다른 이질적인 존재"라며 "남극에 살았던 베가비스 이아이의 특징에서 이 새가 현생종의 오래된 선조임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