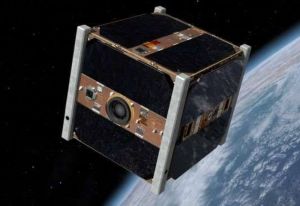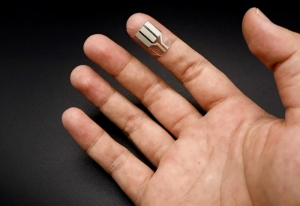해왕성의 중앙부에서 오로라가 관측됐다. 태양계 맨 끝에 자리한 행성 해왕성에서 오로라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중위도에 뜬 이유에도 관심이 쏠렸다.
미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 캐나다우주국(CSA) 등은 지난달 말 각 공식 채널을 통해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이 포착한 해왕성의 오로라를 소개했다.
해왕성에 오로라가 생긴다는 추측은 전부터 있었다. 1977년 발사돼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인공물 보이저(Voyager) 2호가 1989년 플라이바이 당시 수집한 데이터가 결정적이었다. 물론 당시 NASA는 직접적 증거는 잡지 못했지만 해왕성 오로라의 존재 가능성은 강하게 제기됐다.

NASA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차세대 심우주 관측 장비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이 우리 생각이 맞았음을 증명했다”며 “대발견이 가능했던 건 제임스웹우주망원경에 탑재된 근적외선 카메라(NIRCam)”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관측에서 우리는 해왕성 오로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적외선 파장에 의한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 해왕성 관측은 인류에 최초의 해왕성 오로라 이미지를 제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관측에 참여한 영국 레스터대학교 행성학자 라이트 플레처 교수는 “허블우주망원경 등 이전 장비와 달리 적외선 파장을 이용하는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은 해왕성의 닫혀 있던 전리층(태양의 자외선이나 X선에 의해 대기가 전리된 영역)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 이번 관측은 2023년 6월 데이터가 기준이 됐다. 당시 해왕성의 대기 온도나 구조를 분석한 NASA는 다른 행성에서는 주로 극지에 발생하는 오로라가 해왕성에서는 중위도에 나타날 가능성을 점쳐 왔다.
플레처 교수는 “이는 해왕성의 자기장이 자전축에서 47° 기울어진 특수성에 기인한 현상”이라며 “향후 해왕성 오로라의 보다 많은 특징이 속속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이안 기자 anglee@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