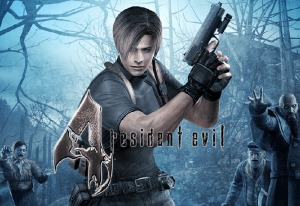1년이 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 세계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동물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연구가 발표돼 눈길을 모은다.
버지니아공대 생물학자 다나 하울리 교수 등 연구팀은 5일 사이언스지를 통해 '자연의 전염병과 사회적 거리두기(Infectious diseases and social distancing in nature)'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염병에 걸린 동물이 다른 개체들과 떨어지는 것은 본능적 행동이며, 때로는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연구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개미와 박쥐, 바닷가재, 벌을 포함한 6종의 사회적 동물을 관찰했다. 이중 개미와 흰개미는 가장 뛰어난 자발적인 격리를 보여줬다. 극도로 사회성이 강한 개미들은 진균포자와 같은 병원균에 노출되면 15분 안에 다른 개미들에게 피하라는 경고 신호를 보낸다. 때에 따라서는 일부가 덤벼들어 병원균을 제거하기도 한다.

이 경우 청소에 동원된 개미들도 감염될 수 있지만, 피해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감염된 개미는 수시간 내 둥지에서 완전히 떠난다. 연구팀은 이처럼 자발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능동적 자가격리(Active self-isolation)'라고 구분했다.
이는 얼핏 이타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사회성 강한 개미들이 동료를 통해 '이기적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기적 유전자(Selfish gene)란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책에서 비롯됐다. 모든 생물에 있어 진화의 주체는 인간 개체나 종이 아니라 유전자이며, 인간 역시 유전자 보존과 후세 전달을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도구에 불과하는 논리다. 즉 개미의 희생은 본능적 행위라는 해석이다.
흡혈 박쥐는 약간 수동적이긴 하지만 비슷한 일을 한다. 과학자들이 박테리아를 투입하면, 흡혈 박쥐의 몸에서는 이와 싸우기 위한 면역 물질이 분비된다. 이로 인해 흡혈 박쥐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얻는다.
텍사스대학교 생물학자 세바스찬 스톡마이어 교수는 "아픈 흡혈 박쥐는 병균과 싸우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무기력해지며, 이 때문에 다른 박쥐들과 접촉이 줄 수 밖에 없다"며 "질병의 부산물로 생겨나는 박쥐의 이런 행동 축소를 '수동적 자가격리(Passive social distancing)'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능동적, 수동적 자가격리에 이은 거리두기의 강력한 행태는 '회피(Avoidance)'와 '강제 격리(Passive isolation)'다.
카리브해의 바닷가재는 주변 가재가 질병의 징후를 보이면 회피를 선택한다. 전염병에 옮기 전 보금자리를 떠나는 이 행위는 포식자들에게 노출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전염병이 그보다 치명적이라고 판단되면, 환자를 피하는 쪽을 선택한다.

가장 잔인한 강제격리는 꿀벌에게서 발견된다. 건강한 벌은 아픈 벌을 격리시키거나 때로는 벌통 밖으로 끌어낸다. 이처럼 동료를 강제적으로 격리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종은 다름 아닌 인간이다.
하울리 교수는 "강제 격리는 일부 영장류에서 관찰됐다는 증거가 존재하지만 포유류에서는 실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제 격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에볼라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에서 주요한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인간이 전염병 발생 과정 중 자발적 자가격리를 얼마나 실행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동물계 전체를 살펴보면 자가격리나 회피, 강제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각 종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집단감염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연구팀은 병원체의 돌연변이를 막기 위해 감염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기간이 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종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고 봤다. 하울리 교수는 "질병을 막기 위해 혼자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채유진 기자 eugene@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