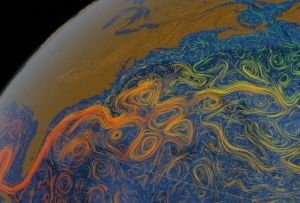자연 속을 산책하면 주의력이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원래 대자연 속에 살던 인류의 DNA가 오늘날에도 일부 이어지는 증거라고 학계는 주목했다.
미국 유타대학교 뇌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실험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연구팀은 자연의 치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대를 특정하지 않고 남녀 92명을 모집했다. 각 피실험자에 뇌파를 계측하는 전극을 장착하고 산책할 때 나타나는 주의력의 변화를 들여다봤다.

구체적으로 연구팀은 피실험자가 산책을 나가기 전 1000에서 7씩 연속해서 빼는 계산을 요구했다. 생각보다 힘든 산수로, 숫자에 강한 사람이라도 몇 분에 걸쳐 이 셈을 이어가면 정신적으로 녹초가 된다.
강제로 뇌의 주의력이 떨어진 피실험자들은 곧바로 산책에 나섰다. 코스는 2개로, 하나는 녹음이 짙은 숲길, 나머지 하나는 무채색 건물이 배치된 아스팔트 바닥이었다.
조사 관계자는 “서로 다른 코스를 걸은 피실험자들의 뇌파 측정 결과를 보면, 자연과 접촉한 이들의 주의력 회복이 두드러졌다”며 “대자연 속에 살던 인류의 DNA를 자극하는 숲길 산책은 여러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연구결과는 여럿 있다. 독일 막스플랑크 인간발달연구소는 2022년 9월 낸 논문에서 자연 속에 단 1시간 머물면 뇌의 스트레스 처리를 담당하는 편도체 상태가 유의미하게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조사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DNA 수준으로 자연과 접촉하려는 원시적 욕구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인간은 초목, 동물과 연결을 본능적으로 갈구하는 바이오필리아(녹색갈증)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대 도시의 생활 환경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자동차, 콘크리트 등 대자연과는 정반대”라며 “도시의 정글 속에서만 살면서 자연과 접촉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인간의 건강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