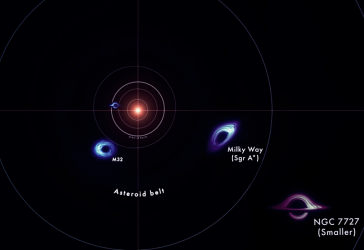대화 중에 상대방의 눈을 좀처럼 마주하지 못하는 것은 뇌의 처리 능력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 나고야대학교 뇌과학 연구팀은 3일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화 상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데는 성격은 물론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는 2018년 일본 교토대학교도 내놓은 바 있다.
나고야대 연구팀은 뇌의 정보 처리 능력과 대화 상대방과 눈맞춤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남녀 피실험자 30명을 모으고 단어 연상 게임을 실시했다.

피실험자들은 컴퓨터로 생성한 애니메이션 얼굴과 눈을 맞추며 특정 단어의 관련어를 생각했다. 그 결과 눈을 똑바로 쳐다볼 경우 단어 연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자동차에 관한 동사를 나열하는 게임에서 눈을 쳐다보지 않은 피실험자들은 '타다' 또는 '운전하다'를 쉽게 떠올렸다. 눈을 마주한 피실험자들은 자동차와 연관된 동사를 제시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이런 경향은 관련어를 답하기 어려운 단어일수록 두드러졌다.
실험 관계자는 "서로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우리 뇌에 있어 의외로 부담이 큰 작업 같다"며 "상대의 눈을 피하는 것은 내성적인 성격도 원인이 되지만 뇌의 능력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선을 맞추는 작업과 단어를 생각하는 작업은 뇌의 같은 인지 자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두 작업이 간섭을 일으키면서 자기도 모르게 대화 상대방의 눈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대화 상대의 눈을 쳐다보는 것이 예의라지만 이런 행위가 뇌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5년 이탈리아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10분간 쳐다보면 의식 변화가 벌어지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험 관계자는 "이야기를 하는 상대가 눈을 돌릴 경우, 뇌가 과부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누군가 대화 중에 눈을 피하더라도 감정이 상할 필요는 없다. 단지 자신의 뇌를 조정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