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인체 냉동 보존(크라이오닉스, cryonics)을 목표로 하는 독일 스타트업에 관심이 쏠렸다.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인체 냉동 보존은 의료나 우주개발 등 다양한 방면의 활용이 기대되는 첨단 기술이다.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투모로우 바이오(Tomorrow Bio)는 7일 공식 채널을 통해 지금까지 개발된 인공 냉동 기술의 개요를 발표했다. 투모로우 바이오는 한 번 동결된 인체를 완전히 이전 상태로 다시 깨우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냉동 보존은 현재 의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일단 얼려 미래에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SF 세계에서는 친숙한 이야기지만 이를 실현한 과학자나 기업은 지금껏 없다. 약 50년 전 미국 미시간에 세계 최초의 연구소가 설립됐지만 아직 얼린 사람이 제대로 깨어났다는 발표는 없다.
이런 불완전성에도 인체 냉동 보존은 많은 관심을 받는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불치병에 걸렸다면 냉동 보존해서라도 나중에 고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투모로우 바이오는 인간 4명과 반려동물 5마리를 냉동 보존하고 있다. 몸 전체를 냉동 보존하는 데 약 20만 달러(약 3억원)가 든다. 고급 스포츠카 가격이지만 부유층에게는 부담 없는 금액이라 이미 700명 이상 등록했다. 8만3000달러(약 1억2000만원)를 내고 뇌만 동결할 수도 있다.
이 회사처럼 인체 냉동 보존 기술을 개발하는 곳은 더 있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회의적인 의견도 적잖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신경학자 클라이브 코언 교수는 "지금까지 냉동 상태에서 살아난 인간은 한 명도 없다. 설사 깨더라도 뇌에 심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인간만큼 복잡한 뇌 구조를 가진 생물이 살아난 적이 없는 점에서 지금의 냉동 보존은 개념이 터무니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뇌세포 같은 것을 다루는 나노바이오는 상당한 수준까지 발달했지만 아직 불완전하다"며 "나노바이오나 이론 생물학이 현실의 갭을 메운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공수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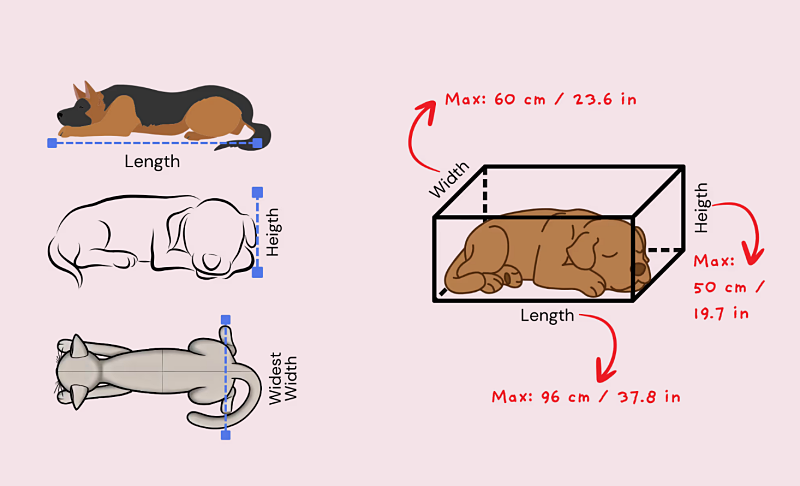
여러 비판에도 투모로우 바이오의 생각은 확고하다. 일시적으로 심장이 정지됐다 다시 뛰기 시작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999년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스키 사고로 임상적으로 2시간 동안 죽었던 안나 바겐홀름이라는 20대 여성이 살아난 사례가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시신을 꽁꽁 얼리는 것이 아니라 극저온 보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 곳곳에 얼음 결정이 생겨 조직이 파괴된다"며 "계약자가 사망하면 곧장 냉동 보존 처리가 시작된다. 시신은 영하까지 냉각되지만 이후 동결방지제가 투여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동결방지제는 체내의 수분을 모두 대체한다. 디메틸설폭시드(DMSO)와 부동액 등에 사용되는 에틸렌글리콜이 주성분이다. 이렇게 조치하면 계약자를 -125℃에서 -196℃까지 시신을 냉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동결한 시신은 스위스 보관시설에서 소생을 기다리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물론 소생 시기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1000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결국 시기는 큰 문제가 아니다. 온도만 제대로 유지하면 사실상 무기한 냉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인체 냉동 보존이 불안하다고 보는 것은 누군가 과감하게 실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냉동 보존 기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겠지만 원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 기술은 윤리 문제도 넘어야 한다. 100년 넘게 잠들었다 치료법이 개발돼 냉동에서 깨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은 예전에 죽은 뒤이므로 보호자 문제가 발생한다. 뭣보다 한 번 고칠 수 없게 된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로 보는 학자도 적잖다.
정이안 기자 anglee@sputnik.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