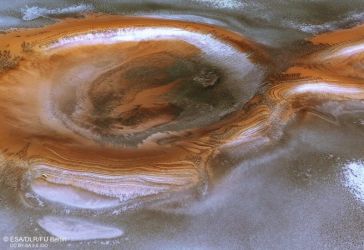영화 '양들의 침묵' 속 한니발 렉터를 통해 그려진 동족 포식, 즉 카니발리즘(cannibalism)은 현대에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다. 근대사에 있어 유럽은 야만을 계몽하는 문명적 존재로 스스로를 포장했지만 실은 카니발리즘이 존재한 것은 역사가들이 밝혀낸 사실이다.
카니발리즘을 다년간 연구한 스페인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대학교 역사학자 아벨 로렌조 로드리게즈 박사는 저서에서 중세 유럽 사람들은 인체의 일부를 치료제로 간주했다고 강조했다. 즉 당시 유럽인은 몹쓸 병에 걸리면 타인의 몸 일부를 약처럼 섭취하고 낫기를 바랐다.
아무리 중세라도 남의 살을 쉽게 취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때문에 사람들은 야밤에 무덤을 노렸다. 당연히 위정자들은 골치가 아팠는데, 로마제국 법률을 정리한 5세기 테오도시우스 법전이나 7세기 서고트 법전은 무덤을 파헤치는 행위를 엄금했다. 아울러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살이나 혈액을 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7세기 이후에도 여러 유럽 국가들은 치료약의 재료를 얻기 위해 무덤을 파는 행위를 막았다. 해당 법률들이 유럽에서 널리 퍼져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은 약으로 인체의 일부를 먹는 관행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로드리게즈 박사는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가 확립됨과 동시에 다양한 죄와 그에 대응하는 벌을 나열한 회개 안내서가 유행했다"며 "이런 책들은 폭력과 성생활의 관점에서 중세 초기 교회가 사회를 규제하는 데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혹은 어떤 것을 인정했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박사는 "8세기 아일랜드 법전은 타인의 피나 소변을 마시다 적발되면 빵과 물의 섭취를 7년간 금하는 벌을 내렸다"며 "다른 법전에서도 인간의 고기나 피를 취한 동물은 부정하므로 이를 요리해 먹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7세기 잉글랜드 캔터베리 대주교 테오도루스 타르시엔시스는 치료를 위해 남편의 피를 마신 여성을 벌했다. 로드리게즈 박사는 이런 증거들이 치료의 일환으로 인간의 체액이나 몸의 일부를 섭취하는 습관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했음을 시사한다는 입장이다.

치료 목적이 아닌 카니발리즘도 중세 유럽에 존재했다. 기독교는 성인으로 간주된 사람을 추앙하는 문화가 있는데, 성인의 몸이나 유물을 건드린 것을 먹는 행위가 유행했다. 예컨대 성인의 무덤을 통과한 기름이나 물, 혹은 장지의 먼지나 돌은 치유와 기적적인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 인기가 많았다.
근대에 와서도 여러 책에는 인체의 일부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기록이 남았다. 이러한 신념은 인간의 피를 먹는 흡혈귀나 늑대인간 등 설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로드리게즈 박사는 봤다.
박사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식민지화되기 이전부터 카니발리즘은 야만적인 이교도와 기독교의 문화적 투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며 "기독교는 카니발리즘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세련되게 포장해 이용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이안 기자 anglee@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