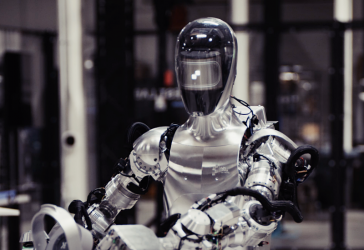책은 과거를 조명하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창(窓)이라고 했다. 세계 역사에 기록된 참사나 사회문제, 현재의 코로나처럼 지구촌을 뒤흔든 재난들이 모두 예측 가능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여기 타이타닉호 침몰부터 오늘의 코로나 록다운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정확히 기록한 기서들을 소개한다.
1. Futility, Or The Wreck of the Titan(모건 로버트슨, 1898)

모건 로버트슨은 1898년 펴낸 이 책에서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의 침몰을 정확하게 예언했다. 이 단편소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사치스러운 배 타이타닉이 북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빙산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건을 그렸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동명 영화로 너무나 유명한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14일 오후 11시40분 북대서양을 항해하다 빙산과 부딪힌 뒤 두동강이 났고 이튿날 오전 2시 20분 완전히 침몰했다. 사고 선박의 탑승인원은 모두 2224명이며, 이 중 710명이 구조되고 1514명이 목숨을 잃었다.
모건 로버트슨의 소설은 사고 14년 전에 출판됐다. 하지만 마치 실제 사고를 보고 들은 것처럼 세세한 묘사를 담았다. 배의 이름을 거의 특정한 것도 모자라 침몰한 장소까지 맞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2. Earth(어스, 데이비드 브린, 1990)
지구촌을 강타한 기상변화를 예측한 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출신으로 우주공학을 전공한 소설가 데이비드 그린의 역작이다. 미항공우주국(NASA)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그는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가 야기할 끔찍한 기상재난들을 책을 통해 생생하게 경고했다.
2038년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한 '어스'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최근의 폭우 등 기상이변을 전망했다. 뱅갈만의 수위상승에 따른 방글라데시의 습지화와 30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는 대규모 홍수피해도 내다봤다.
책이 나올 당시 세계 각국은 인류의 개발욕구가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부른다는 심각성을 막 인지할 때였다. 데이비드 그린의 책이 출판되자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과장됐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현재 그의 예언이 정확했음을 알 수 있다.
3. Thr World Set Free(해방된 세계, 하버트 조지 웰스, 1914)
영국 출신의 SF소설 거장 조지 웰스가 펴낸 '해방된 세계'는 인류의 원자력발전을 예측했다. 당시의 과학기술을 꿰고 있던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인류가 1933년 원자로부터 막대한 에너지를 얻게 될 것으로 장담했다.
책이 출판된 1914년, 헝가리 출신 미국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가 그 유명한 핵연쇄반응을 발표했다. 레오 실라르드는 미국 원자폭탄계획을 발상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조지 웰스는 '해방된 세계'에서 심지어 원자에너지 활용이 인류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4. Gulliver's Travels(걸리버 여행기, 조너선 스위프트, 1726)

너무나 유명한 환상소설 '걸리버 여행기'는 보통 주인공 걸리버가 소인국과 거인국을 다녀온 에피소드로 알려졌다. 의사이자 과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스위프트는 '걸리버 여행기' 속 환상적인 모험 곳곳에 영국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내용을 끼워넣었다.
특히 그의 소설은 현재 과학자들이 풀려고 애쓰는 미지의 우주도 다뤘다. 대표적인 것이 화성을 공전하게 하는 라퓨타인의 위성에 대한 묘사다. 이 부분을 모티브로 한 애니메이션이 스튜디오 지브리의 '라퓨타'다. 참고로 '걸리버 여행기'는 1편 릴리퍼트(Lilliput, 소인국), 2편 브롭딩낵(Brobdingnag, 거인국), 3편 라퓨타(Laputa, 공중에 뜬 섬)와 발니바르비(Balnibarbi), 럭낵(Luggnagg), 글럽덥드립(Glubbdubdrib), 지팡(일본의 옛 이름), 4편 휴이넘(Houyhnhnms, 말 종족의 나라)으로 구성된다.
인류가 화성의 위성 포보스와 데이모스를 실제 발견한 것은 '걸리버 여행기' 출판 150년 뒤인 1877년의 이야기다. 게다가 스위프트는 화성의 위성들이 보여주는 변칙적 궤도까지 묘사했다. 이런 그의 공적을 기려 화성의 제1위성 포보스의 표면 분화구 여럿에 스위프트 소설 속 등장인물 이름이 붙었다.
5. From the Earth to the Moon(지구에서 달까지, 쥘 베른, 1865)

기발한 상상력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쥘 베른은 이 책을 통해 인류의 달착륙을 내다봤다. 쥘 베른의 '지구에서 달까지'는 이후 동명 영화로 수 차례 만들어지는 등 1800년대 과학계는 물론 문화계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줬다.
'지구에서 달까지'에서 쥘 베른은 우주비행사들이 거대한 대포를 통해 달로 쏘아올려진다고 묘사했다.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를 태운 미국 우주선 아폴로11호가 인류 최초로 달표면에 착륙하기 무려 100년 전 소설임을 감안하면 감탄이 나온다.
훗날 NASA가 워낙 유명한 이 책 내용을 따랐을 수도 있지만, 쥘 베른은 이 책에서 미국인 3명이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정확히 묘사했다. 심지어 우주선을 쏘아올린 지역이 플로리다인 점도 맞혔다.
6. The Machine Stops(기계는 멈춘다, E.M. 포스터, 1909)
세계 각국의 록다운, 즉 행동제한 현상을 100년 전 내다본 소설이다. 실제 오늘의 지구촌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사람간 접촉이 제한된 비대면 사회가 정착되고 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죄다 지하에서 지내며, 화면이나 메시지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나눈다. 인류가 살기 위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기계가 대체하는 사회지만, 이 기계가 멈춰버리면 사람들의 미래도 없는 암울한 교훈을 담았다.
BBC 평론가이자 작가인 윌 곰퍼츠는 '기계는 멈춘다'를 들어 "2020년 인류의 록다운을 소름끼치도록 정확히 예측한 책"이라고 극찬했다.
7. Fahrenheit 451(화씨 451도, 레이 브래드버리, 1953)

미국 소설가 레이 브래드버리의 역작이다. 1966년 프랑스에서 동명 영화가 제작됐고, 우리에게 익숙한 마이클 무어 영화 '화씨 9/11'은 이를 패러디한 제목이다.
이 소설은 책이 금기시된 미래세계를 다뤘다. 사람들의 눈이 종이와 활자 대신 TV 등 화면에만 집중되는 세태를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렸다. 레이 브래드버리의 책이 나오자 평단은 사람과 대화에서 멀어져 종일 TV에 빠져 사는 세상에 일침을 날렸다고 반겼다. 다만 그의 소설이 나온 뒤에도 우리 일상은 변화가 없다. TV를 덜 보는 대신 PC와 스마트폰 화면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8. Stand on Zanzibar(잔지바르에 서라, 존 브러너, 1968)
미래소설가 존 브러너는 이 책에서 미국의 현재를 내다봤다. '잔지바르에 서라'에는 베니니아라는 가상의 아프리카 국가와 오보미라는 대통령이 등장한다. 이후 미국에선 이름도 비슷한 버락 오바마가 흑인 최초의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외에도 소설 속에는 미국의 무차별총격사건과 유럽연합 탄생이 제법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뭐든 질문하고 답을 얻는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같은 IT 서비스도 앞서 묘사했다.
9. The Narrative of Arthur Gordon Pym of Nantucket (낸터킷의 아서 고든 핌의 이야기, 에드거 앨런 포, 1838)
미국 추리 거장 에드거 앨런 포의 대표작으로, 낸터킷 섬 출신 아서 고든 핌의 모험을 담았다. 놀랍게도 이 소설은 인류의 식인풍습, 즉 카니발리즘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소설은 한 포경선이 풍랑을 만나 조난 당하고, 그대로 표류하면서 선원들이 겪는 극한의 상황을 그렸다. 식량과 물이 바닥나자 살기 위해 동료를 희생시키고 그 살을 발라먹는 참상이 담겼다.
물론 포의 소설이 카니발리즘(Cannibalism)을 예언한 것은 아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카니발리즘은 책이 나온 1838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한다. 아프리카 일부 부족이나 중국 고대 부락민처럼 풍습에 따라 사람의 살을 취하는 사회학적 카니발리즘은 역사가 아주 길다. 참고로 식인은 이 사회학적 카니발리즘과 병리학적 카니발리즘, 즉 한니발 렉터처럼 쾌락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는 경우로 구분된다.
놀라운 것은 이 책이 나온 50년 뒤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미스터리로 가득한 미뇨넷호 식인 사건이다. 1884년, 영국 선박 미뇨넷호가 희망봉으로부터 180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난파됐는데, 표류하던 선원들은 살기 위해 희생자를 지목, 잡아먹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무시무시한 계획은 선원 한 명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표류 18일째 실행에 옮겨졌다. 갈증을 못 이긴 17세 소년 리처드 파커가 바닷물을 마신 채 탈진상태로 발견되자 선장이 그를 살해하고 살과 피를 선원들과 먹고 마셨다. 이들은 6일 뒤 독일 선박에 구조됐으나 선체에 남은 사람 뼈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체포됐다. 모살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선장과 선원들은 당시 절박한 상황이 인정돼 이후 감형됐다.
정이안 기자 anglee@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