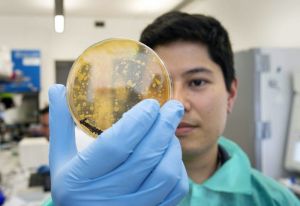멸종위기종 범고래의 천적은 인간이라는 낯부끄러운 사실이 최근 연구로 재확인됐다. 해양 먹이사슬의 정점 범고래를 위기로 내몬 것이 인간의 유해화학물질이라는 지적 속에 나온 결과여서 씁쓸하다.
캐나다 농무부 소속 동물병리학자 스티브 라버티는 태평양 동부에서 하와이에 걸쳐 발견된 야생 범고래 사체 53구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범고래들의 사인을 분석한 그의 연구결과는 2일자 미국 온라인 학술지 PLOS ONE에도 게재됐다.
이번 조사는 사육 개체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야생 범고래만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팀은 죽은 야생 범고래들의 지방 두께에 주목했다. 스티브 라버티는 “대개 사람은 신장과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 양을 추정하는 BMI(body mass index)를 사용한다”며 “범고래 역시 BCI라는 비슷한 지표가 있다. 이를 통해 영양 및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감염증 등 질병으로 죽은 범고래의 경우 BCI가 낮다. 염증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영양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이다. 외상 등으로 죽은 범고래의 경우, 건강한 상태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기 때문에 병사한 개체와 비교해 BCI가 높다.
죽은 야생 범고래의 외형과 BCI를 분석한 연구팀은 사체 53구 중 22구의 사인을 추측해냈다. 스티브 라버티는 “아직 어린 범고래의 사인은 감염증과 영양 불량이었다”며 “성숙한 범고래와 나이든 범고래의 경우 세균감염 등 질병이나 충돌에 의한 외상이 두드러졌다”고 언급했다.
연구팀은 결과적으로 야생 범고래들이 죽은 이유는 인간과 직간접적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덴마크 등 유럽 연구팀들은 범고래의 생식기능과 면역기능이 폴리염화페닐(PCB) 등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물질 탓에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티브 라버티는 “그간 학술적 발견들을 통해 범고래의 사인에 인간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조사한 야생 범고래들은 오염물질에 노출돼 병에 걸리거나 어망에 얽히고 어선과 충돌해 죽음을 맞았다. 인간의 욕심이 범고래들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번 사체 분석 결과 가정이나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수 속 기생충이 바다로 흘러들어 톡소플라스마증(toxoplamosis, 톡소포자충증)을 감염시킨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톡소플라스마(toxoplasma)가 원인인 이 병은 포유류와 어류, 조류, 파충류 등에서 관찰되며 소뇌증이나 뇌척수염, 뇌염 등 치명적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
연구팀은 환경오염물질을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기 위한 국제적 감시망이 강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 선박 등으로 야기되는 범고래와 충돌사고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캐나다나 미국은 범고래 주요 서식지역에 수중음파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다. 평소와 다른 울음소리가 감지되면 인근 선박에 속도를 줄이도록 주의를 주는 등 조치가 내려진다.
스티브 라버티는 “범고래를 지키려면 지금까지 알려진 환경오염물질이나 이로 인한 질병뿐 아니라 물리적 사고도 줄여야 한다”며 “범고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이안 기자 anglee@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