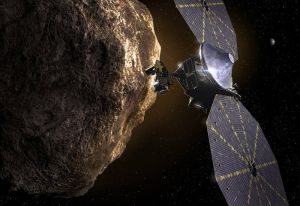국민이 집단 이익을 중요시하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나라들이 코로나 방역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둔다는 것은 상식 수준의 예측이다.
그런데 이 빤한 짐작을 실제로 연구한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알고 보니 국가별 방역 차이를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능력이 아닌 '문화의 차이'였다.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문화심리학자 미셸 겔팬드 교수 등 연구팀은 최근 더 랜싯 저널을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엄격한 문화'란 사회적 규범을 강하게 준수하고 위반에 대해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를 말한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질병과 같은 외부적·집단적 위협을 많이 경험한 문화는 생존을 위해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무질서를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겔팬드 교수는 "우리는 과거의 연구를 바탕으로 엄격한 문화가 느슨한 문화보다 팬더믹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며 "연구 결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연구 대상이 된 나라는 57개국이다. 엄격함-느슨함은 '이 나라에는 사람들이 준수해야하는 사회적 규범이 많다' '이 나라에서 누군가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등 6개 항목에 점수를 매긴 연구팀의 2011년 자료가 바탕이 됐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일본, 한국, 중국, 호주 등이 엄격한 문화를 가진 국가로,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는 느슨한 국가로 구분됐다.
연구 결과 2020년 10월 기준 가장 느슨한 국가들은 평균치 보다 5배 많은 감염자와 9배에 달하는 사망자를 기록했다. 그중 브라질과 미국은 100만명 당 2만4000건 이상의 감염과 무려 700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반면 인구 100만명 당 1만건의 감염을 기록한 싱가포르는 단 5명의 사망자를 내는 데 그쳤다.
뉴질랜드와 같이 느슨한 문화권에서도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방역에 잘 대처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인도와 보츠와나와 같이 문화적 긴장감이 높은 국가지만 혼란한 국내 상황으로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예외도 있었다.
그럼에도 연구 결과는 문화적 느슨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방역의 성패는 국가의 조치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인구나 경제수준, 지역적 특성, 기온과도 큰 관계가 없었다.
겔팬드 교수는 "느슨한 국가는 집단적 위협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처럼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정신은 창의성과 혁신에는 탁월하지만 집단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2개국에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느슨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감염에 대해 훨씬 덜 걱정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지에 따라 조이고 느슨해지는 능력인 '문화적 양면성'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채유진 기자 eugene@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