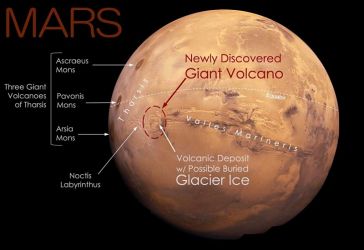현대과학으로 아직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임사체험’이 실은 인류의 진화메커니즘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와 벨기에 리에주대학교 연구팀은 지난달 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사람이 임사체험(near-death experience)을 하는 것은 동물처럼 가사(假死, thanatosis)를 연기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흥미로운 가설을 제기했다.
연구팀은 무당벌레나 주머니쥐 등 일부 생물이 천적 앞에서 죽은 척을 해 위기를 모면하는 가사 또는 의사(擬死, death mimicry) 기술이 임사체험의 실체라고 판단했다. 인류 역시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경험하며 의사를 진화적 산물로 체득했는데 이게 뜻하지 않게 임사체험을 부른다는 주장이다.

실증을 위해 연구팀은 피실험자들을 동원해 사자 같은 맹수나 흉악범, 돌진하는 자동차 등 위험한 상황을 가상체험하게 했다. 심장박동이나 혈압, 발한, 체온 및 뇌 활동을 살핀 결과 피실험자들은 강렬한 공포를 느낄 때 의사 및 임사체험에서 각각 나타나는 신체반응을 동시에 보였다.
리에주대학교 연구팀은 5년 전 실험에서 임사체험 시 측두정엽 등 뇌 일부 영역 활동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당시 연구팀은 뇌 일부 영역이 활성화·비활성화되면서 임사체험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임사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뇌 특정 영역의 반응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포식자들은 움직이지 않거나 포획 후 축 늘어지는 먹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이를 감각적으로 아는 약한 동물들은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사를 모방하는 기술을 익혔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 역시 다양한 위험요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의사 모방 기술을 갖게 됐다”며 “다만 동물과 달리 언어를 습득했기 때문에 의사 상태에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970년대부터 과학계가 연구해온 임사체험은 심장이 멈춘 사람의 뇌가 한순간에 정지하지 않고 일부 기능을 유지하면서 벌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차이는 있지만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 중 4~18%가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다.
소설가 헤밍웨이도 겪은 것으로 전해지는 임사체험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보며 깨어나는 형태나 죽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유체이탈이 일반적이다. 사별한 배우자를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구름 위를 떠다니다 갑자기 지상으로 떨어졌다는 이도 있다. 사후세계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영화나 드라마에도 종종 등장된다. 사후세계를 과학적 분석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은 임사체험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뇌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
정이안 기자 anglee@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