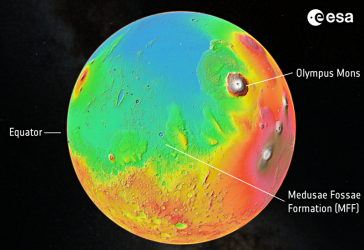건강한 삶을 위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한다. 일부 학자들은 짧은 수면에도 활력을 유지하는 일명 '쇼트 슬리퍼(short sleeper)'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사실일까.
'롱 슬리퍼(long sleeper)'의 상대 개념인 쇼트 슬리퍼는 7~9시간의 권장 수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6시간 미만만 자고도 일과 취미, 운동 등 다양한 일이 가능하다는 쇼트 슬리퍼는 역사적으로 꽤 많다. 불멸의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이 잠을 적게 자면서 역사에 남을 성과를 낸 대표적 인물로 전해진다.
쇼트 슬리퍼에 대한 논란은 오래됐고, 지금도 계속된다. 잠을 적게 자면서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몸이나 뇌에 상당히 무리를 준다는 학자도 많다.
쇼트 슬리퍼가 실존한다는 학자들은 유전자를 거론한다. 아일랜드 메이너스대학교 수면 전문가들은 쇼트 슬리퍼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며, 유전적 체질에 따라 얼마든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학교 행동신경과학자 앤드루 쿠건 교수는 "수면 시간이 짧아도 아무렇지 않은 쇼트 슬리퍼는 적게 자고도 낮에 졸지 않고 인지력 관련 장애나 감정 저하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쇼트 슬리퍼는 적게 자도 몸에 이상이 없다. 결코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교수는 "자는 시간이 적으면 그만큼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쇼트 슬리퍼를 동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유감이지만 쇼트 슬리퍼는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며, 유전자에 의해 선천적으로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쇼트 슬리퍼와 유전자의 연관성을 제기한 연구는 2014년 국제 학술지 '슬립(Sleep)'에 실린 것이 유명하다. 연구팀은 BHLHE41 유전자 변이가 쇼트 슬리퍼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변이가 비렘(non-REM) 수면, 즉 정상 수면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전체 수면 시간을 단축하고 수면 부족의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연구팀 주장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19년 신경 분야 국제 학술지 '뉴런(Neuron)'에는 ADRB1 유전자 변이가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는 논문이 게재됐다. 이 변이는 10만 명 중 4.028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의 연구를 종합할 때 학자들은 쇼트 슬리퍼가 실존하며, 특정 유전자 변이가 원인이라고 본다.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쇼트 슬리퍼는 지구촌 인구의 약 1% 또는 그보다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스스로를 쇼트 슬리퍼로 착각해 무리하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쿠건 교수는 "6시간 미만만 자도 개운하다는 사람 대부분은 착각"이라며 "이는 유전자와 무관하게 짧은 수면에 익숙해진 것으로, 일시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심신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수면 시간은 일생 변화한다. 유아, 어린이가 청년보다, 청년이 중장년 또는 노인보다 오래 자는 것이 정상이다. 또한 수면 시간만큼이나 수면의 질이 아주 중요하다.
쿠건 교수는 "진짜 쇼트 슬리퍼는 짧은 시간에도 양질의 수면을 자는 극소수의 사람들"이라며 "사실 정해진 수면 시간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스스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명상이나 영양 섭취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