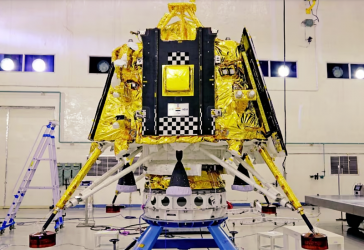죽어가는 사람의 뇌 활동이 일시적으로 고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자들은 수수께끼의 뇌 활동이 임사체험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의심했다.
미국 보르지긴 연구소는 4일 공식 채널을 통해 죽음이 임박한 사람의 뇌 활동이 짧지만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는 심장이 정지된 동물의 뇌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하며, 임사체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팀은 2014년 이후 미시간대학교 의료센터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사례를 자세히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혼수상태에 이른 70대와 20대 환자 2명의 데이터에 주목했다. 이들은 심정지 또는 뇌출혈을 일으킨 뒤, 의사가 상황을 지켜보는 동안 숨을 거뒀다.

이들의 뇌전도(EEG) 기록을 분석한 연구팀은 뇌 일부분에서 감마파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아냈다. 감마파는 뇌의 각 부위가 연결돼 인지 활동 또는 운동을 수행할 때 관찰된다. 참고로 알파파는 긴장이 풀릴 때, 베타파는 의식이 고조되거나 감정적 요동이 심할 때 두드러진다.
미시간대 교수이자 보르지긴 연구소를 이끄는 지모 보르지긴 교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뇌의 감마파가 양반구의 각 부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감지된 것은 특이하다"며 "기록 상 발작에 따른 후유증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감마파는 뇌세포가 주위를 인식할 때와 같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마파의 고조는 신경을 매개로 각 기관의 관계를 유지하는 뇌 신경상관의 중심부에서 두드러졌다"며 "이는 사람이 꿈을 꿀 때, 또는 환각이나 유체이탈을 겪을 때 나타나는 감마파 패턴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겪었다는 임사체험은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세계 각지에서 보고가 이어지면서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지모 보르지긴 교수는 2013년 심정지를 일으킨 쥐와 빈사 상태의 인간 뇌 상황을 비교하며 공통점을 찾는 실험을 진행했다.
죽음 직전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명하는 연구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의사가 사망선고를 한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거나, 염까지 하고 입관한 시신이 되살아나는 아찔한 상황을 줄일 수 있고, 장기기증의 기준 역시 체계화할 수 있다. 유감이지만 아직 의학계는 인간의 몸이 죽어 완전히 침묵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해명하지 못했다.
보르지긴 교수는 "생물의 각성 상태를 훨씬 뛰어넘는 뇌 활동이 단시간에 급상승하는 것이 임사체험과 연관됐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라면서도 "임종에 이르러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끈질기게 연구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한 삶은 물론 웰다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