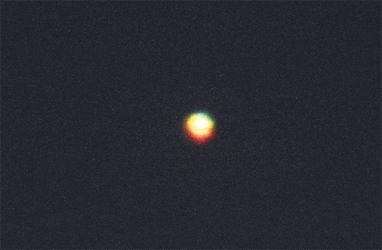식물은 뇌가 없지만 스트레스를 분명히 기억하며,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셰필드대학교 식물학 연구팀은 6일 낸 조사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경험을 기억하고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면 대처하는데, 식물 또한 비슷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연구팀은 결론 내렸다.
연구팀은 식물이 세균이나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비결을 조사했다. 선행 연구에서 식물의 기억 능력은 확인됐지만, 뇌가 없는 관계로 정확한 구조는 미스터리였다.
연구팀이 주목한 것은 식물의 유전자다. 포유류를 비롯한 동물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면역계를 진화시켜 왔다. 이 면역계는 모든 병원균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과거에 경험한 병원균을 기억한다. 이때 생체 메모리칩 역할을 하는 것이 기억 T세포와 기억 B세포다.

식물은 뇌는 물론 기억 T세포와 기억 B세포도 갖지 않았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식물의 기억 시스템은 면역 프라이밍이다. 식물의 기억을 유지하는 면역 프라이밍은 인간의 백신에 의한 면역 획득과 유사한 구조로 일단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이 다음 공격에 더 강하게 방어하게 해 준다.
연구팀에 따르면, 식물의 면역 프라이밍은 세포 내의 유전자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가동된다. 인간의 유전자는 살면서 겪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 DNA의 염기서열을 바꾸지 않고 유전자 기능을 조정하는데, 이를 에피제네틱스 변화라고 한다.
조사 관계자는 “식물의 경우 에피제네틱스 변화를 트랜스포존(전위인자)을 이용해 실행한다. 트랜스포존은 움직이는 유전자로 불리는 DNA 조각으로, 이름 그대로 게놈 내를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이동은 돌연변이의 방아쇠가 되기 때문에 식물의 트랜스포존 대부분은 스위치가 꺼져 있다”면서도 “질병 감염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치를 바꿔 스위치가 켜진다. 이것이 기억처럼 작용해 질병에 대한 방어 유전자가 신속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식물의 방어 시스템에 대가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조사 관계자는 “트랜스포존 스위치가 켜지만 식물의 면역이 강해지는 대신 자라기 어려워지는 듯하다”며 “식물은 외부 공격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우리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언급했다.
다만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가 강하면 면역 프라이밍의 기억은 훨씬 강해지고 경우에 따라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조사 관계자는 “우리 연구에 따르면 식물이 반복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에피제네틱스 변화가 DNA에 축적됐다”고 전했다.
식물의 면역 프라이밍은 수명이 몇 주로 짧은 애기장대부터 수백 년이나 사는 가문비나무 등 장수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에서 확인됐다.
정이안 기자 anglee@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