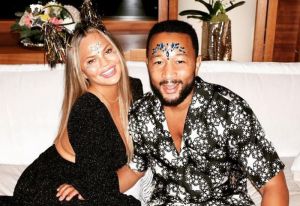덩치가 큰 새들은 대체로 지능이 낮다는 학자들의 견해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다만 타조는 예외로 확인됐다.
영국 브리스틀대학교 조류학 연구팀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까마귀나 앵무새는 영장류와 맞먹는 지능으로 유명한데, 그보다 크고 날지 못하는 조류는 대개 멍청하다는 게 학자들의 생각이었다.
연구팀은 이 가설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에 나섰다. 덩치가 큰 고악류의 지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팀은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에뮤와 레아(아메리카타조), 타조를 모으고 퍼즐을 풀게 했다.

연구팀은 투명 원반에 작은 구멍 5개를 뚫고 새들이 좋아하는 양상추를 넣었다. 원반은 작은 구멍이 하나뿐인 다른 원반으로 막았다. 때문에 새들은 양상추를 먹기 위해 원반을 알맞게 돌려야 했다. 상당히 간단한 퍼즐이지만 새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조사를 주도한 페이 클락 박사는 “이 과제는 유연한 인지력에 근거한 지능 혁신(이노베이션)이 가능한지 평가하기 좋다”며 “에뮤 3마리, 레아 2마리, 타조 4마리 등 총 9마리에 퍼즐을 풀게 했더니 에뮤 3마리와 레아 1마리가 90% 확률로 먹이를 먹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답률이 높은 에뮤는 가장 멍청한 새로 널리 알려졌다. 심지어 레아 1마리는 휠 가운데 볼트를 풀어 먹이를 한꺼번에 꺼내 먹었다”며 “이는 전혀 다른 유형의 인지력 혁신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험에서 타조 4마리는 모두 퍼즐을 풀지 못했다. 이에 대해 페이 클락 박사는 “고악류의 인지력 혁신은 까마귀나 앵무새에서 보이는 것만큼 고도의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타조를 제외하면 고악류들은 학자들의 편견과 달리 일정 수준의 인지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사는 “우리 연구를 통해 조류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능이 발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머리 나쁜 새로 치부해 온 비교적 원시적인 조류도 학습에 의해 지식을 확장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귀중한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