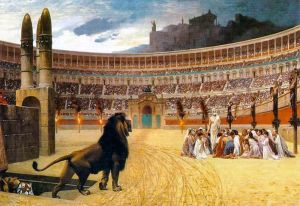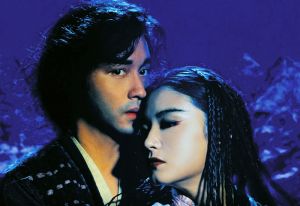아무리 배가 불러도 달달한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는 농담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포만감을 느껴도 단 것을 원하는 이유는 뇌와 깊이 관련됐다.
독일 막스플랑크 대사연구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험 보고서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최신호에 공개했다. 연구팀은 식후 포만감을 관장하는 신경세포가 단 음식을 요구하는 스위치까지 함께 눌러 버린다는 사실을 실험에서 알아냈다.
당분은 단시간에 에너지를 보급하는 중요한 성분이다. 동물은 당분을 인식하면 적극 섭취하도록 뇌 프로그램이 진화했다는 가설은 과학계에서 오래됐다.

실험 관계자는 "쥐 실험에서 단 음식을 인식한 것만으로 뇌 속 경로가 활성화되고 진통이나 도취 작용을 하는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오피오이드 물질이 방출됐다"고 전했다.
이어 "쥐는 배가 부른 후에도 단 것을 계속 먹었다. 프로오피오멜라노코르틴(POMC)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군이 그 열쇠를 쥐고 있었다"며 "당분을 추가 섭취한 쥐의 뇌 안에서는 이 신경세포군이 빠르게 활성화돼 배가 부른데도 식욕이 추가로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포만한 상태에서 당분을 추가로 먹을 경우 베타 엔도르핀이 방출돼 다른 신경세포에 보상감을 준다고 결론 내렸다. 이 오피오이드 경로를 차단하자 쥐는 즉시 당분을 더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이 오피오이드 경로가 당분을 더 섭취할 때만 활성화하고, 일반 또는 지방분이 많은 식사에서는 활성화하지 않는 사실도 확인됐다.

실험 관계자는 "당분을 더 원하는 현상은 배부른 쥐에서만 두드러졌다. 공복의 경우 베타 엔도르핀 방출을 억제해도 효과가 없었다"며 "또한 당분을 처음 접하는 쥐라도 입에 들어간 순간 베타 엔도르핀이 방출됐고 이후 추가로 먹을 때마다 반응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쥐와 똑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됐다. 공복감을 관장하는 뉴런 근처에는 수많은 오피오이드 수용체가 분포했다"며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실험 결과는 이치에 맞다. 자연계에서 당분은 드문 것이지만,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하므로 동물의 뇌는 이에 민감하게 프로그램됐다"고 설명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