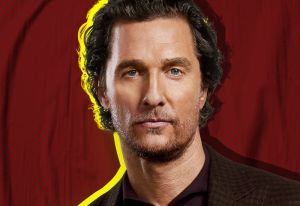음식 냄새를 맡으면 포만감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 살이 찐 경우는 예외로 확인됐다.
독일 막스 플랑크 대사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Metabolism Research, MPIMR)는 11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타볼리즘(Nature Metabolism)에 음식 냄새가 식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소 대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식사 전 냄새를 맡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신경경로를 발견했다. 다만, 이 효과는 평균 체중 이하의 쥐에 한정되며, 과체중 쥐는 신경 회로가 작동하지 않았다.
MPIMR 제니스 불크 연구원은 "후각 만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활성화하는 신경세포회로는 내측 중격이라는 뇌 영역에 자리한다"며
"이 회로는 음식 냄새에 대해 두 단계에 걸쳐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단계에서 쥐가 음식 냄새를 맡게 되면 단 몇 초 만에 신경세포가 활성화해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며 "이런 빠른 반응은 이 신경세포 네트워크가 냄새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 즉 후각구에 곧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이 신경회로는 음식 냄새에만 반응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2단계 반응은 쥐가 실제로 먹이를 먹기 시작할 때 일어나며 이로 인해 신경세포 네트워크의 활동이 억제된다. 다만 이미 포만감을 얻은 관계로, 쥐가 먹는 먹이의 양은 전체적으로 적었다. 연구팀은 굳이 이런 메커니즘이 진화한 것은 식사 시간을 짧게 함으로써 적에게 당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추측했다.
흥미로운 것은 뚱뚱한 쥐는 냄새에서 포만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실험에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쥐는 음식 냄새를 맡아도 배가 부르지 않고 식사량이 줄어드는 일도 없었다.

제니스 불크 연구원은 "비만이 후각계, 특히 후각구의 기능을 무디게 하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일"이라며 "음식 냄새에 의한 포만작용이 뚱뚱한 쥐는 예외인 것도 같은 이유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 결과가 인간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인간의 뇌에도 쥐와 같은 내중격 신경세포군이 존재하는 점에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봤다.
제니스 불크 연구원은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냄새를 식전에 맡으면 식욕이 억제되는 점이 확인됐다"며 "반대로 비만인 사람은 식욕이 증가하는 점에서 후각과 식욕의 관계에는 개인차나 체중에 의한 영향이 크게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